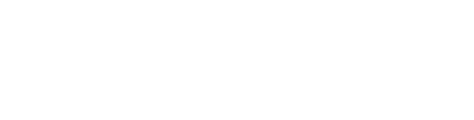|
해마다 설이 와 떡국을 먹을 때면 내 머리 속을 맴도는 그림이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을 거의 할머니와 지냈다. 설이 다가오면 할머니는 큰 다라이에 쌀을 담아 방아간에 가지고 갔다. 평화동 네거리 가까이에 있는 떡방아간은 서정에 있었다. 서정은 전주천 남쪽에 있는 건지산 주변 동네를 이르는데, 아마 전주성 서쪽에 정자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다. 동네 이름은 서학동이다. 내가 다녔던 전주교대부속국민학교도 서학동에 있다. 부속학교 정문에서 건지산 쪽 길 건너에 떡방아간이 있었다. 아마 근동에 이 방아간이 유일했을 것이다. 설이 다가오면 이 방아간에는 쌀을 담은 다라이들이 줄을 지어 놓여 있었다. 다 가래떡을 뽑으려고 동네 사람들이 갔다 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선친은 나에게 임무를 하나 매낀다. 누가 쌀을 훔치거나 방아간에서 떼어먹을 수 있으니 지키라는 것이다. 하긴 당시 방아간에서 쌀이나 떡을 떼어 먹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긴 했다. 이 방아간은 거의 매일 밤세워 떡을 뺐으니 굳이 쌀을 훔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의 시셈이 그런 풍문을 만들었을 것이다.
떡방아간 앞에서 노다거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네거리 사람들이 떡을 해 가지고 나오면 먹어보라며 가래떡 한쪽을 팔뚝만하게 뚝 떼어 준다. 나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뜨거운 가래떡을 들고 후후 불며 먹는다. 동네 아이들이 가래떡을 물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장관이다. 떡이 다 될 쯤이면 할머니가 와서 거들고, 가래떡 다라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할머니의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며, 노래를 부르며 뛰어 돌아다녔다. 그처럼 즐거울 수 없었다. 가져온 떡을 할머니는 장방 윗목에 상을 펴고, 그 위에 널어 놓고 말렸다. 며칠이 지나 떡이 어느 정도 마르면 떡을 칼로 썬다. 대동할머니도 와서 같이 밤새 똑똑 떡을 썰며 도란거리는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자고는 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날 무렵 집안이 무너지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인천 쪽으로 간다는 말만 들었다. 삼십대 후반의 아버지는 거의 폐인이 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집이 그해 겨울처럼 가난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설이 다가오는데 쌀이 떨어졌는지 할머니는 떡을 하지 못했다. 섣달 그믐날은 하루 종일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적반을 부치고 갖은 음식을 만들어 설맞이를 한다. 할머니도 그날 정지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는데 떡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설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작은방에서 아버지와 나, 동생이 설상을 받았는데 떡국이 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버지도 놀라며 숟가락을 뜨는데, 그건 떡국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밀가루를 가래떡처럼 둥글게 밀어 떡국떡 모양으로 썰어 국을 끓여 내온 것이다. 설날 아침에 자식들한테 떡국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할머니는 견디지 못한 것이다. 집에 배급으로 받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모양으로 썰어 끓인 국이다. 밤새 밀가루 반죽을 미는 할머니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이다. 그날 아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으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비치는 것은 보지는 못했다. 나는 그날의 떡국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누르면서 살았는지 모른다.
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추운 겨울 난방도 없는 구파발 판자집 한켠에서 설을 앞두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매서운 추위에 떨며 상을 치뤘다. 서러운 마음이 세상을 차갑게 몰아쳤는지 모른다. 할머니의 평생 눈물이 눈발이 되어 가는 길을 하얗게 덮었다.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주강씨댁 많이 본 기사
1
|